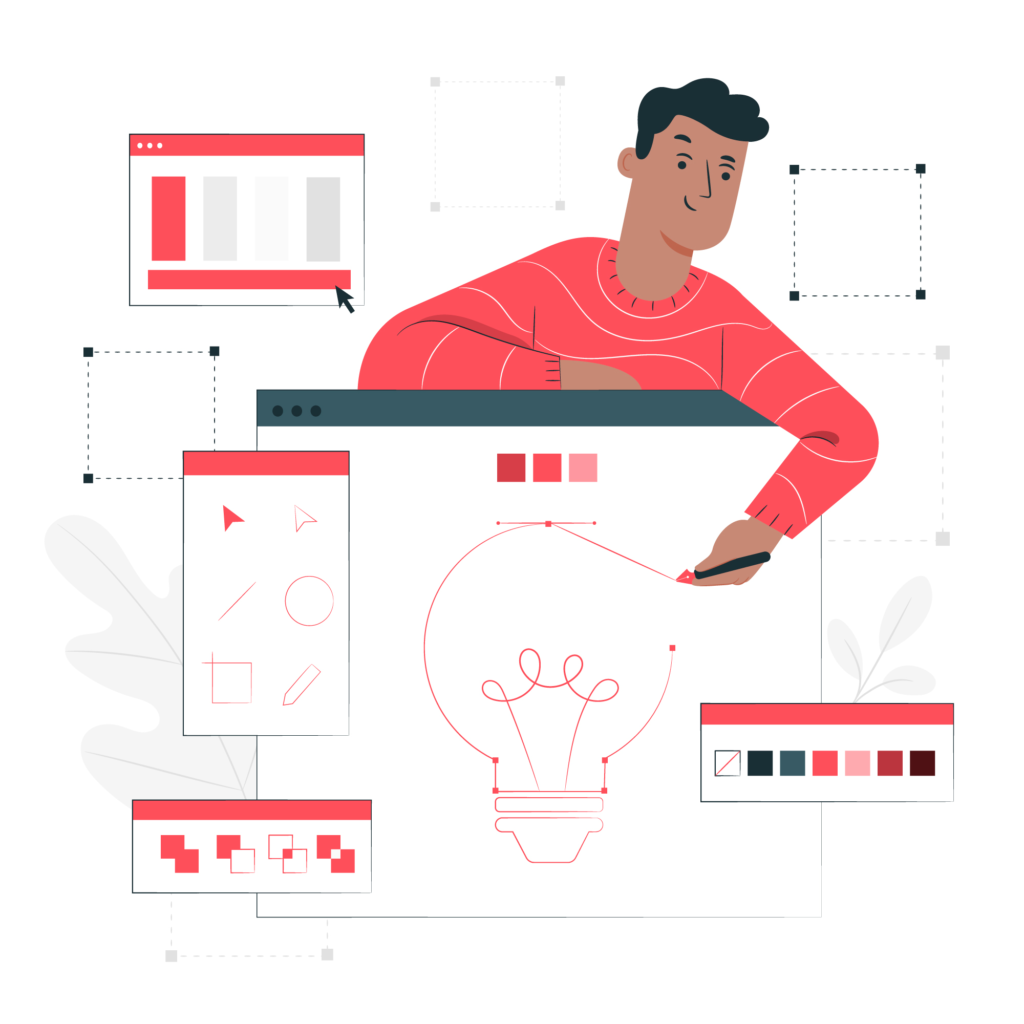유남주(가명)님은 "왜 프로젝트가 끝나도 계속 뭔가를 만들고 싶을까?"라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코드와 시스템을 조금 더 정리하고 쓰기 좋게 만들려 했지만, 다른 팀원들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던 터라 더 그랬나 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노력이 내게 필요한 걸까?"라는 의문도 생겼습니다. 팀원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개선 작업이 실제로 팀에 도움이 되자, 그는 "팀을 위해 한 일도 아닌데 이득을 줬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가 문제를 파고들어 만든 결과물은 팀에 실질적인 이익을 줬습니다. 어떤 때는 관심과 인정을 받지 못했고, 어떤 때는 기여했고 인정 받았습니다. 사실 그는 팀의 목표를 우선시한다기보다는 자신이 편하려고 개선하려는 개인적 욕구 사이에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어떻게 서술해야 할지 고민이 깊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주의자로서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
개발 경력이 짧을수록 프로젝트 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가 허전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남주님은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규모 있는 팀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이지만, 그는 신입 시기에, 그것도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 이를 혼자 시도했습니다.
UI 요소가 제각각인 상태가 거슬렸다는 게 그가 시작한 동기였습니다. 팀원들은 문제로 보지 않았지만, 그는 코드가 뒤엉켜 있는 걸 모른 척하기 싫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개인적인 동기가 결과적으로 협업 효율을 높였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그의 디자인 시스템을 뒤늦게 접한 팀원들은 진작에 썼으면 좋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례는 왜 굳이 신입이 이런 걸 만들었을까?, 라는 물음을 낳지만, 그 답이 곧 그의 특성이 됩니다. "난 무질서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지 못한다"는 성향이었죠. 취업 활동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유남주님의 속성이자 특성, 즉, 혼란스러운 현상을 보고,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움직이는 시스템주의자같은 특성이 그와 나누는 대화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개인적 동기가 팀 시너지를 만든다
팀 프로젝트와 팀 목표는 그에게도 중요하지만, 그의 실제 행동 동기는 "이게 보기 싫어서"였습니다.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독학으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기술 자료를 찾아보며 실험했습니다. 신입이 혼자 남들이 중요하게 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피드백이나 협조가 충분치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가 자신의 행동 동기에 진심이었던 것은 팀 협업을 소화하면서 따로 시간을 더 들여 자신의 행동 동기를 실행하고 실천했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그 과정은 팀 설득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팀의 걱정을 해소했습니다. 이 자발적 노력은 다른 팀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남들이 귀찮아하던 설정이나 컨벤션 정립이 끝나자, 모두가 컴포넌트를 재활용해 편의를 얻었습니다. 내가 만족하니 팀도 이득을 본다는 이상적인 구조가 생겼습니다.
문제 정의가 구체적이면 해결책도 명확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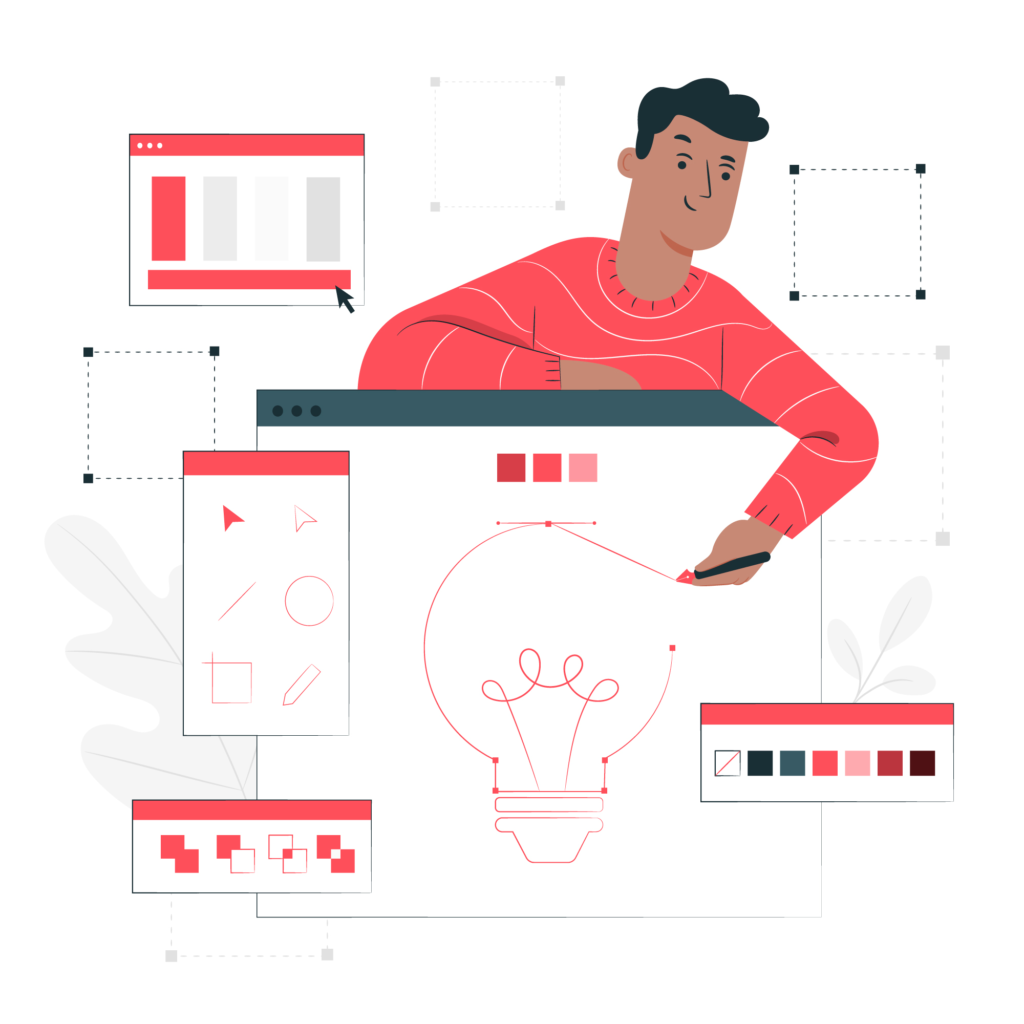
디자인 시스템 사례를 더 살펴보면, 그는 UI가 불편하다는 막연한 느낌에서 출발해 색상 코드를 공유하지 않으면 매번 확인이 필요하다, 동일한 모달창 코드를 각자 다르게 작성해 혼란이 생긴다, 처럼 구체적인 문제를 짚어냈습니다. 이런 명확한 문제 정의가 해결책을 또렷하게 해줬습니다. 그는 "이게 너무 거슬린다"는 직관을 여러 갈래로 분석했습니다. 글이나 대화로 풀어내며 대안을 고민했고, 그 결과물이 디자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점은 이력서 서술에도 중요합니다. UI가 불편했다, 정도로는 눈길을 끌기 어렵습니다. 반면 통일된 색상이나 컴포넌트 기준이 없어 오류와 혼란이 생겼다, 처럼 문제를 구체적으로 쓰면, 문제를 찾고 고민해 해결했다는 인상, 즉 그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면접관은 어떻게 문제를 인식했고, 해결 과정에서 팀을 어떻게 설득했는지를 더 묻고 싶어지겠죠.
나를 드러내는 글이 곧 이력서 주제가 된다
이력서는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야 합니다. 조직 목표나 팀 협업을 강조하더라도, 실제 동기가 다르면 면접에서 말이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에 회사들은 어떤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인지 들려주길 원하지요.
유남주님의 경우, "나는 문제를 그냥 못 본 척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시스템 차원에서 개선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발상이 팀원들에게도 편의를 주었고, 뒤늦게라도 도입하길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인적 성향이 조직의 성과로 이어진 예시입니다. 팀 목표에 방향 조정된 상태에서 수립한 개인의 목표와 동기를 기어코 실행해 개인의 성장과 팀에 기여를 이뤄냈습니다.
"내겐 대단한 프로젝트가 없는데…"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결과가 크든 작든 중요한 건 무엇을 문제로 보고, 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어떻게 행동했는가라는 흐름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면 작은 결과라도 충분히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물론, 신입으로서 그에게 디자인 시스템 구축 경험은 작은 결과는 아니지만요. 🙂
마치며
"나도 이런 개인 동기가 있을까? 팀에 도움이 되도록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든다면,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Flow), 피터 드러커의 개인 동기와 팀 성과 관련 저서, 브레네 브라운의 자아성찰과 협업 연구 등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푸딩캠프 뉴스레터에서 다룬 0071. 몰입 환경을 설계해 학습 생산성 높이기 콘텐츠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유남주님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신입이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성과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애초에 왜 굳이 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지만, 대화를 통해 "나는 내 눈에 거슬리는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각이 이력서 주제를 분명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나를 설명하는 문장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 일을 했는지, 남들은 안 했는데 나는 왜 했는지를 계속 물어야 정리됩니다. 그렇게 찾아낸 나만의 이야기가 이력서를 명료하게 만들어주는 주제가 됩니다.